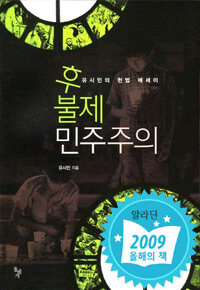반응형
|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되었든 추상적인 것이 되었든, 책이란 것이 독자의 첫 느낌을 능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겠다" 싶어서 집어든 책이 처절한 실망감으로 귀결되는 경우는 있어도, "꼭 읽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애써 무시하며 펼친 책이 그 첫 느낌을 능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그렇습니다. 신경숙의 이 책은 후자의 케이스였습니다.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신경숙 소설집, 문학과지성사, 1993. * 본문 286쪽. 박혜경의 해설 및 작가 후기 포함 총 304쪽. 신경숙의 오래 전 책을 꺼내 읽은 데에는 아마도 최근작 「엄마를 부탁해」의 인기가 작용했을 겁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라는 것이 이번처럼 저를 항상 독서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이유로 유인 당한 경우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작 「엄마를 부탁해」를 택하기 보다는 아마도 초기 작품집이었을 「풍금이 있던 자리」를 펼친 것이긴 하지만요. 올해 들어서는 제 나름의 독서 패턴을 유지하자는 생각에, 가급적 서평단 리뷰어 신청을 자제하면서, 소설과 비소설을 교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홍세화의 「생각의 좌표」와 고종석의 「여자들」 같은 비소설 사이에 낀 것은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1월 22일(금)에 읽기 시작했고 1월 25일(월)에 읽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독파'한 것이 아니라 '읽기를 그만둔 것'은, 읽기 싫어서(!)입니다. 더 읽는 것이 저에게는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유는 아래 본문에서 적도록 하지요. ※ 소설이라는 것이 여타 장르와 마찬가지로 호오가 갈리고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는 장르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적은 후기의 내용과 다른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작가가 된 데에는 나름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필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소설가 신경숙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은 이 서평을 읽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 풍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소설집 - 책이 독자의 첫 느낌을 능가하긴 어렵다 ▩

|
1. 이 책은? 이 소설집은 신경숙의 두번째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소설집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장편이 아니고, 단편소설을 묶은 책입니다. 신경숙이 비교적 초기에 쓴 총 9편의 단편이 실려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풍금이 있던 자리 - 직녀들 - 멀어지는 산 - 그 女子의 이미지 - 저쪽 언덕 - 배드민턴 치는 女子 - 새야 새야 - 해변의 의자 - 멀리, 끝없는 길 위에 <해설> 추억, 끝없이 바스라지는 무늬의 삶 - 박혜경 <작가 후기> 2. 책에 실린 단편들에서 공통적으로 받은 인상 1) 배우자 있는 사람 사랑하기. 2) 왜인지 알 수 없는 어깃장의 행동들. 3) 죽음과 자해를 너무 쉽게 택하는 사람들. 4)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 묘사. 이 책에 실린 단편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받은 인상은 대략 위와 같은 정도로 요약됩니다. 어느 한 편에서 등장하는 특징이 아니라 여러 편에서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인상입니다. 작품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구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이 특징들이 주된 소재이자 스토리텔링의 기본 줄기가 됩니다. 읽는 도중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단적인 예로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의 내면 묘사를 내가 알아야 할 이유는 뭘까." 그런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8번째 단편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하여 읽었으나 9번째 소설에서 과감히 그만 읽기로 했습니다. 더 읽는 것은, 최소한 나에겐 시간낭비다! 3.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작가 작가 신경숙은 책의 말미에 실린 작가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 글쓰기가 대체로 저의 비사회성을 전시해놓은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결함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삶은 사랑이라고 일러주었던 것이기에,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반추해보고 지키고 살게 해주는 통로이기도 하기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304쪽, <작가 후기>에서) 신경숙의 소설은 적어도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에 관한 한, 신경숙의 말대로, "비사회성을 전시해놓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소설을 그만 읽기로 한 데에는 그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신경숙은 겸양의 치레로 한 말이겠지만 "여러 가지 결함들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켜" 놓은 거 같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읽기를 중단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바로 위의 2번 항목에서 적은 그런 인상과 오버랩되는 면이 있습니다. "결함의 미화"라는 신경숙의 말에 저로선 이 소설집에 관한 한 흔쾌히 수긍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 역시 "삶은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건강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는 사랑을 두고서 "삶은 사랑"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4. 신선한 표현법들, 하지만! 말줄임표와 쉼표와 괄호의 적절하고도 신선한 활용, 감칠 맛 나는 사투리 구사, ... 등등 구체적인 인용은 하지 않더라도, 이 소설집에서 높이 살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말 그대로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에 수긍하는 쪽이지만, 표현법이 소설을 먹여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표현법을 넘어서는, 표현법을 빛나게 할, 내용적인 면에서의 그 무언가가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필하는 것을 소설의 본질 또는 알맹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에 그 알맹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에서 그 알맹이는 뭘까. 읽는 동안 끊이지 않고 제 머리 속을 스쳤던 물음입니다. <리뷰의 요약> (긴 글 읽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 - 비교적 신경숙의 초기 작품들을 묶은 두번째 작품집. 단편소설 9편으로 구성. - 신경숙이 인기 작가임을 확인시켜준 「엄마를 부탁해」로 인해 읽게 된 책. - 책이란 것이 독자의 첫 느낌을 능가하는 법이 없음을 확인시켜준 책. - 여덟편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그 이후는 읽기를 그만둔 책. - 어쩌면 작가가 후기에서 말한 자신의 한계는 겸양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한계가 아닐까. 2010 0306 토 00:10 ... 01:30 비프리박 p.s. 신경숙의 작품을 읽어보겠다고 구입해둔 책으로, 이 책 말고 두권짜리 「깊은 슬픔」도 있는데요. 읽어야 하나, 내심 고민이 되는군요. 포스트의 제목에 적은대로, 책이란 게 독자의 첫 느낌을 넘어서는 법이 여간해선 어렵다 보니. -.-;;; |
반응형
'소통4: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 부러운 독서광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읽기 [2] ▩ (15) | 2010.03.15 |
|---|---|
| ▩ 진보의 미래, 노무현의 고민과 모색,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 (18) | 2010.03.14 |
| ▩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 공감 1000% 다치바나 다카시의 독서론 [1] ▩ (12) | 2010.03.09 |
| ▩ 머그 메이트(mug mate), 4계절 유용한 컵 워머(warmer), 아쉬움이 조금! ▩ (20) | 2010.03.03 |
| ▩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의 발과 펜으로 복원한 혁명가의 삶과 실천! ▩ (29) | 2010.02.26 |
| ▩ 무라카미 하루키, 렉싱턴의 유령, 인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단편집 ▩ (10) | 2010.02.21 |
| ▩ 가수 린(Lyn), 유희열의 스케치북, 소름 돋은 아이돈케어(I don't care)! ▩ (20) | 201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