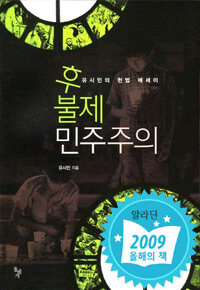반응형
|
누군가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한가지 원인을 말한다면 저는 그 원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이라면 그 어떤 현상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그 누구에게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태형, 불안증폭사회: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 위즈덤하우스, 2010. * 본문 294쪽, 총 307쪽. 저 역시 자본에 의해 강요되어 온 신자유주의 시스템에는 반대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때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 모두 불행해지고 있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회를, 사회적 집단심리를, ...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라면 간단명료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책의 리뷰 1편( http://befreepark.tistory.com/1261 )에 이은 리뷰 part 2입니다. 서평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독성을 위해, 나누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하나가 너무 길면 스크롤다운의 유혹이 커지죠. ^^a |
▩ 불안증폭사회, 김태형의 '공동체', 말투, 과장된 사실. 공감과 설득력의 문제. ▩

'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앞서 올린 리뷰 파트 1의 구성 +
1. 이 책은? 이 책을 읽다가 덮어버린 이유? 2. 덜 분석적인, 덜 분석적인. 3. 나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4. 책에서 말하는 공동체, 다른 차원의 해법 신자유주의로 인해 '불안증폭사회'를 사는 개인들, '자기 운명 결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지배와 착취가 폐지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식의 해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에게는 그저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까요. 집단의 운명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자기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바라는 천국이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만이 아니라 모든 지배와 착취가 폐지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화목한 집단이어야 한다.
(115쪽, <무력감>에서) 차원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1) 개인의 운명은 집단의 운명에 걸려 있다. 2) 집단은 지배와 착취가 폐지된 화목한 집단이어야 한다. 1)과 2)는 차원이 안 맞습니다. 문제와 해법이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해법이란 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컨대, 몸살로 심하게 아픈 사람에게 무병장수의 신약(神藥)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문제와 차원을 달리하는 해법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배와 착취가 폐지된"이라는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지배와 착취의 철폐' 좋죠. '지배와 착취의 철폐'가 어떤 사상이 그리는 이상 사회의 한 특징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 이상 사회는 희망될만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우리 당대에 구현될 것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라 우리 손자 세대에도 구현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이상 사회'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이상 사회'에 관한 묘사의 일부일테니까요. 이게 과연 '현실적' 의미를 가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배와 착취의 폐지"에 공감한다 해도, 읽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 겁니다. 5. 책에서 사용되는 말투와 과장이 좀... 말투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책에서 쓰는 말투,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쓰는 말투 등등 우리는 상황에 따라 층위에 맞는 말투를 구사하죠. 이 책은 이 층위를 넘나듭니다. 그건 저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긴 하겠으나 읽는 사람으로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시작전권까지 완전히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자들은 마치 지구의 종말이라도 본 듯이 생난리를 치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자기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125쪽)
인류의 전쟁사를 대충 훑어만 보아도 단순히 쪽수나 무기가 월등한 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 옛날 수나라의 대군이 쪽수가 모자라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무참하게 깨졌는가? 아니면 미국이 무기가 후져서 베트남전에서 패했는가? (127쪽). (125, 127쪽, <의존심>에서) * 밑줄은 비프리박. 밑줄친 부분에서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도 점잔빼는 말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말투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과연 책에서 저런 말투를 써서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적지 않게 등장하는 "얼마전, 어떤 모임에 참가했을 때"(77쪽) 하는 식의 서술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작위적인 상황설정의 냄새를 짙게 풍길 뿐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느낌 밖에 주지 못합니다. 6. 표현의 자유와 사실의 과장 사이. 이 책에는 그 외에도 과장 섞인 사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그 뒤를 이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군부독재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켰다.
(101쪽에서) 문학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역사적 사실의 테두리 내에서라야겠죠. 1987년 6월 항쟁이 '군부독재를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켰다'면 최소한 그 이후의 노태우 정권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집권은 과연 근부독재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김태형이 말하는 군부독재는 전두환 정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한 것일까요. 이 책에는 이런 식의,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 맞붙은 한나라당과 통일민주당은 서울에서 박빙의 접전을"(132쪽) 같은 대목도 있군요. 현실에선 애초부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고 결과는 40:7 이었죠. 김태형은 이걸 '박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11 0128 금 06:10 ... 08:40 비프리박 2011 0128 금 1055 분리 2011 0201 화 09:20 ... 09:50 서두&가필 |
반응형
'소통4: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마법에 걸린 나라(조기숙), 담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사회를 지배한다. 참여정부의 패착점! ▩ (16) | 2011.02.08 |
|---|---|
| ▩ 하버드 특강 '정의' 마이클 샌델 강의 보다가 완전 빵 터진!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강의) ▩ (69) | 2011.02.06 |
| ▩ 2011년에 시도하는 새로운 독서 프로젝트, 2월에 읽을 책들, 도서 리스트. ▩ (15) | 2011.02.04 |
| ▩ 불안증폭사회, 김태형은 과연 '벼랑 끝에 선 한국인의 새로운 희망 찾기'를 할 수 있을까. ▩ (18) | 2011.01.28 |
| ▩ 조한혜정 교수 「다시 마을이다」, 위험 사회에서 살아남기. 마을, 학교 공동체, 집단적 생존. ▩ (9) | 2011.01.26 |
|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01(한겨레), 대한민국을 들여다 보는 객관적인 관점과 시야 ▩ (18) | 2011.01.24 |
| ▩ 불평등사회의 인간존중(리처드 세넷). 복지정책에 결합되어야 할 존중(respect). ▩ (20) | 2011.01.21 |